Y-Zine
[루 리드 추모 특집 #6] 모르겠다. 무엇이 아방가르드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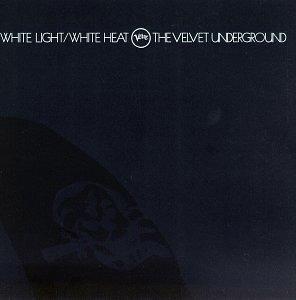
- 음악 정보
나는 중학생 시절부터 전영혁의 음악세계를 들었다. 하지만, 헤비메탈 관련해서만 귀를 기울이고, 나머진 대부분 졸며 들었던 게 사실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침대 머리맡에 라디오를 틀고 자다가 디스토션이 걸린 전기기타 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의 나날이었다고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래서 노래가 끝난 후, 다시 한 번 아티스트와 곡명을 알려주는 전영혁 아저씨의 진행 방식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나는 음악잡지도 별로 읽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들의 입소문을 듣는 편에 가까웠다. 명반과 아티스트 목록을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머리가 매우 나빠서 친구들의 얘길 듣고 따라 외울 능력은 없었다. 그렇다보니 나는 소위 명반선 혹은, 매니아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필수 음반, 뭐 이런 쪽에 참 둔감했다. 그렇게 나는 주변과 다른 나만의 음악세계에 빠져 들어갔다. 고교시절, 동기들 사이에 꽤 알려진 음악광이었으나 나의 음악세계는 소위 정통파로 칭해지는 녀석들과는 거리가 좀 있었다. 본 조비(Bon Jovi)를 듣지 않고 신데렐라(Cinderella)만 좋아했으며, 머디 워터스(Muddy Waters)를 건너뛰고 버디 가이(Buddy Guy)부터 들었고, 다들 『Saxophone Colossus』에 미쳐있는데 혼자 『Way Out West』의 리듬에 빠져있었다. 사실 지금도 주변의 음악 전문가들과 그닥 불화한 취향이기도 하다.
이런 나에게 벨벳 언더그라운드(the Velvet Underground)나 루 리드(Lou Reed)의 존재는 음악 좀 아는 멋진 녀석들이 가끔 떠드는, 그러나 대화 할 때만 “오~ 그래?” 하곤 바로 잊어버리는 이름이었다. 이들의 존재가 나에게 처음 제대로 인식된 건, 음악 매니아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지만, 대학교 때가 되어서였다. 대학 동기 중에 기타 치는 녀석이 있었는데, 나와 음악적인 교집합이라곤 블랙 새버드(Black Sabbath)와 디어사이드(Deicide), 오비추어리(Obituary) 정도 밖에 없었다. 어두운 음악을 좋아하지만, 그 친구의 취향은 루 리드, 닉 케이브(Nick Cave), 아니면 샴 69(Sham 69)부터 훑어오는 진짜 펑크의 세계였고, 나는 어둠을 각종 헤비메탈과 블루스 방면으로 확장시켜온 처지였다. 이상하게도 장르 취향의 다름이 우리에겐 반목이 아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녀석의 옥탑 자취방에 나의 앰프와 베이스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 점차 씨디, LP를 녹음한 테이프들이 쌓여갔다. 서로가 좋아하는 씨디를 한 장씩 겹쳐서 쌓아놓고 들으며 녀석은 담배를, 나는 소주를 마셨다. 볼륨을 맘껏 키워놓고 라면을 먹었고, 펜타토닉을 한답시고 시작해서 트로트로 끝나는 말도 안 되는 잼을 했다.
어느 밤, 녀석은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음악을 듣자며, 5장의 씨디를 왕창 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아는 노래가 꽤 많이 들어있었다. 남들과 다른 음악을 주로 들어왔지만, 어쨌건 들리는 대로 듣긴 했으니 귀에 남아있던 찌꺼기가 좀 있긴 했던 모양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녀석은 『The Velvet Underground & Nico』(1967)에 이어 『The Velvet Underground』(1969)를 먼저 듣고 난 후 『White Light/White Heat』(1968)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두 장을 들으며, “어! 어디서 들었지? 나 이 노래 들어봤는데....!”를 외치긴 했지만 졸음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별 기대 없이 『White Light/White Heat』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야만 했다. 왜냐고? 음악이 귀를 파고들기 시작했으니까.
루 리드의 추모를 위해 이렇게 개인적이고 길고 재미없는 얘기를 한참 떠들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에게 루 리드는 음악적 완성도나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가장 친했던, 집에서 보내준 등록금을 악기 사는 데 써버리고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방랑벽이 심해서 걸핏하면 사라지던 친구 녀석과의 추억 속에서 의미가 찾아지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앤디 워홀(Andy Warhol)과 니코(Nico)와 결별한 밴드는 무언가 분노했던 모양이다. 그것도 꽤나 독하게 말이다. 그 분노를 약기운에 실어 벨벳 언더그라운드 스타일로 한참을 토해낸다. 데뷔작이 로큰롤의 ABC를 비트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번엔 로큰롤의 강렬함이 우선 밀려온다. 「White Light/White Heat」부터 그렇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 노래 막판에 가서 무모할 정도의 마구잡이 피킹을 해대는 베이스가 한참을 흐른다. 아마 그 베이스 소리를 들으며 잠이 깼던 거 같다. 이어서 잊을 수 없는 「The Gift」가 등장한다. 스테레오의 좌우 채널을 이용해 왼쪽은 중얼중얼 글을 읽고, 오른쪽은 날 것의 록이 흘러간다. 철렁대는 베이스와 하울링이 심한 기타 연주는 벤딩을 참으로 성의 없이 해댄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노래는 뭔 얘긴지 도통 모르겠는(가사를 찾아 읽어보면 소포 포장을 뜯다 주인공까지 잘라 버리는 대목에서 더 아스트랄해지는 경험에 빠지게 된다.... 무슨 애긴지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보시길) 스토리를 묵묵히 읽고 있는 목소리에 자꾸만 집중하게 된다. 어느새 연주에도 집중하게 만든다. 다시 들어봐도 긴장감 넘치는 연주다. 8분이 넘는 곡인데, 밴드의 연주가 환상적인 무엇도 아닌데, 이상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성전환 수술을 그린 「Lady Godiva's Operation」의 노래 사이로 툭툭 던져지는 수술실의 대화와 잡음까지 나올 시점이면 똘끼는 이제 커버만큼이나 시꺼메진다. 「I Heard Her Call My Name」의 로큰롤을 기초로 하는 연주에는 처음 들었던 당시의 내 기준에선 앨범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잡음들을 즐비하다. 이 기타 연주는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다. 친구 녀석은 이와 비슷한 연주를 자주 펼치곤 했다. 나는 잡음을 줄이고 툭툭 끊어지는 소리를 위해 팜뮤트 하는 게 당연했는데, 일부러 잡음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던 녀석의 소리는 나에게 하나의 충격이었다. 이 같은 전기악기와 앰프의 능력(?!)을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선구적으로 해내고 있었다. 나의 우상이던 지미 헨드릭스(Jimi Henrix)나 버디 가이처럼 철저한 노림수가 있는 노이즈가 아닌, 그저 연주의 순간에 예상치 못하게 만들어지는 소리를 일부러 드러내면서 말이다. 이런 노이즈의 향연은 마지막 곡 「Sister Ray」 후반부에 극에 달린다. 확실히 이 곡은 「The Gift」와 달리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난삽하게 들리기 십상이다. 불협화음이 앰프를 통해 협과 불협 사이의 이상한 소리를 오간다. 사람에 따라 참기 힘든 시간일 거다. 실재로 녹음 당시 프로듀서 탐 윌슨(Tom Wilson)은 이 잼이 끝날 때까지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있었다고 한다. 루 리드의 삶에서 가장 막 나가는 순간이다. 동시에 루 리드 이상으로 존 케일(John Cale)의 약기운 똘끼가 벨벳 언더그라운드에 얼마나 만만찮은 뒷심으로 작동했는지 확인시켜준다.
흔히 이 앨범을 아방가르드한 성향의 극치라고들 한다.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무엇이 아방가르드인지. 이 앨범은 고정된 로큰롤에 반대하는 반-로큰롤의 정서와 소리를 통해 로큰롤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는 음악이라 생각한다. 로큰롤이란 게 워낙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긴 하다만, 최소한 그것이 기성세대의 안주하는 삶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이 음악은 순도 100% 로큰롤이다. 노이즈가 난무하고, 연주가 허접해도 복잡하거나 난해하지 않다. 불협화음마저도 직설적이라서 수가 뻔하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음악에 관심 없던 나를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거다. 그럼 이건 정말 좋은 록 음반 아닌가.
the Velvet Underground 『White Light/White Heat』
Verve / 1968. 1. 30. ★★★★

1. White Light/White Heat
2. The Gift
3. Lady Godiva's Operation
4. Here She Comes Now
5. I Heard Her Call My Name
6. Sister Ray
● 멤버
Lou Reed – Vocals, Lead Guitar, Piano
John Cale – Vocals, Electric Viola, Organ, Bass
Sterling Morrison – Vocals, Guitar, Bass
Maureen Tucker – Percussion
● 앨범정보
Produced by Tom Wilson
Recording engineer: Gary Kellgren
Director of engineering: Val Valentin
Editor
-
 About 조일동 ( 151 Article )
About 조일동 ( 151 Article )


